상단 네비게이션 영역
상단 네비게이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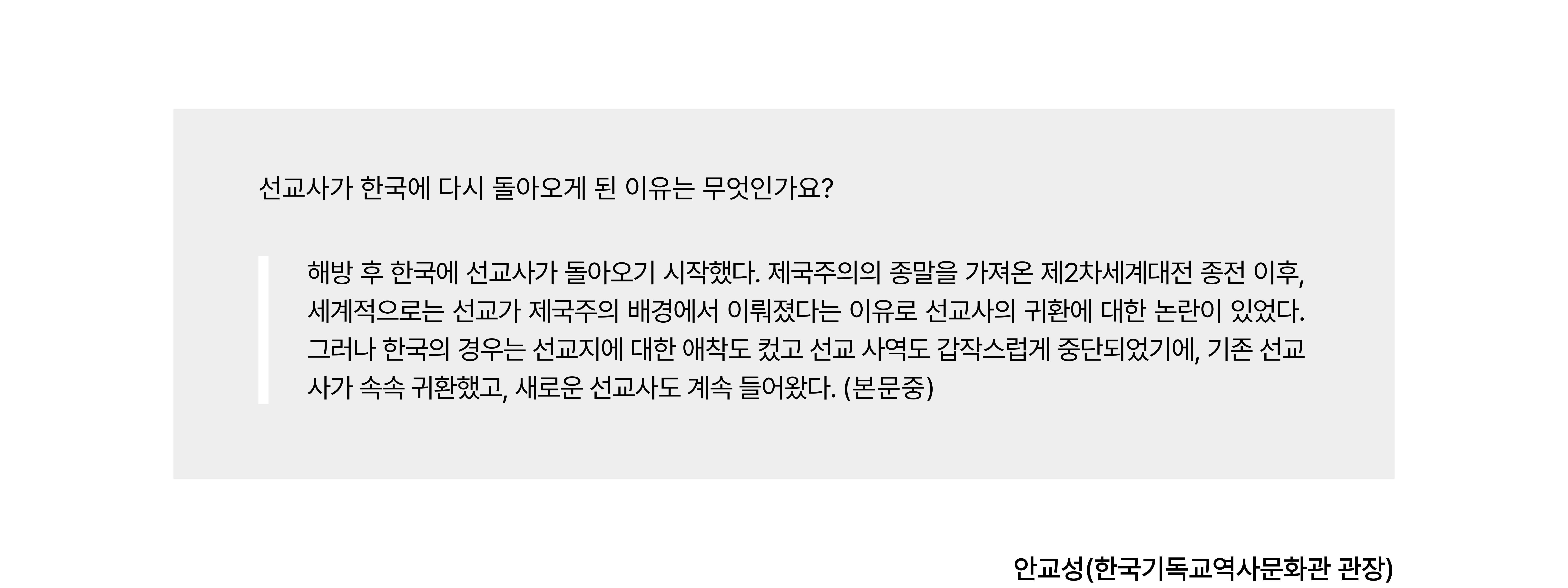
선교가 ‘가라’라는 동사로 시작되었다면, 어떤 동사로 끝이 나야 할까?
근현대 서구의 선교운동은 세월이 흐르면서 두 가지 질문에 직면했다. 첫째는 ‘언제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초창기 선교사는 대개 평생 사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머무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선교사가 오래 머물다 보니, 현지교회가 선교사 철수를 요구하는 ‘선교 유예’(missionary moratorium) 주장까지 나왔다. 물론 선교사가 필요없다는 이 ‘선교 유예’의 입장은 대세의 흐름이 되지는 않았다.
둘째는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선교지 상황이 달라지면서, 선교사나 선교사역에 대한 요구도 달라졌다. 20세기 전반에는 ‘새로운 선교사’라는 주제가 대두되었다. 새로운 선교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모습을 보였고, 현지교회의 선교 전문성을 심화하거나 아예 새로운 분야를 여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도 1920년대부터 선교사 철수나 새로운 선교사 등의 주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한 선교사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다가,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일제에 의해 갑자기 추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방 후 한국에 선교사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의 종말을 가져온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적으로는 선교가 제국주의 배경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선교사의 귀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선교지에 대한 애착도 컸고 선교 사역도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기에, 기존 선교사가 속속 귀환했고, 새로운 선교사도 계속 들어왔다.
선교사는 해방 후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국가적으로는 통역과 고문 등으로 국가 재건에 기여했다. 더구나 정부수립 직후 6.25전쟁이 벌어지자, 전쟁 구호와 전후 복구에 힘썼고, 심지어 참전하여 국가 수호에 기여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 재건에 앞장섰다. 또한 교회, 병원, 학교 등 전통 영역의 범위를 넘어, 문맹퇴치, 가정 사역, 여성 사역, 아동 선교, 방송 선교 등 새로운 영역에 나섰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내면화하도록 성경연구, 묵상 운동도 소개했다. 학원 선교를 도입한 결과, 전도훈련운동이 전국복음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시작됐고,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런 훈련들은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일에도 도움을 주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 산업전도에서 산업선교로 진화한 노동 선교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고, 도시빈민 문제 등 산업화의 어두운 면에 눈길을 돌리게 했고, 무엇보다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고난받는 한국인의 친구요 증인이요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었으며 때로는 이로 인해 추방도 당했다.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서구인이 아니라 해외 동포가 선교사로 한국에 오고 있다. 한국인은 국내외에서 선교 열정을 지닌 민족으로 이제는 오히려 조국에도 선교사로 돌아오고 있다. 시대에 따라 선교사 유형은 달라지지만, 계속되는 것이 있다. 바로 선교사가 현지교회의 일원이 되어, 세계 교회가 하나라는 교회일치운동의 상징이 되는 일이다.